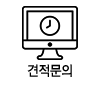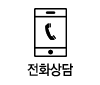[이슬기의 미다시 (미디어 다시 읽기)]
[미디어오늘 이슬기 프리랜서 기자]
▲ 지난해 12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및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관련 손팻말과 응원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연락을 꽤 받았다. 취재원을 연결해달라는 언론의 연락들 말이다. 나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간 오마이뉴스에 '우리는 우리가 놀랍지 않다'라는 제
바다이야기예시 목의 인터뷰 기사를 연재하며 윤석열 탄핵 광장에 선 청년 여성들을 인터뷰했다. 계엄의 밤에 국회로 향하는 군용차를 막아선 김다인,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청년들의 모임을 만든 이재정, '남태령 대첩'을 이끈 농업인 김후주, 바로 그 남태령에서 우리 안의 이주민 혐오를 일깨운 '위아더해군' 등이다. 연락들 덕에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라는
바다신게임 실감과 함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지나갔다는 방증이자, 그 무엇 하나 똑 떨어지게 이뤄진 것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12월 벽두부터 '계엄 1년'에 관한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계엄 1년' 사과 공방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 이재명 대통령이 낼 메시지 등에 관한 것들이다. 기획물로는 '그때 그 계엄의 밤'과 '지난 1년'을 톺아보는 보도들이 나온다. 광장의 시민들 이야기를 기초로 한 방송사의 탐사기획 다큐, 신문사의 인터뷰 기사 등이다.
윤석열 탄핵 광장의 주역이었던 청년 여성, 소수자들은 다시 한 번 언론 앞
릴게임종류 에 섰다. 지난 1일자로 발행된 경향신문의 <12·3 불법계엄 1년… 여성·소수자들은 그저 '응원군'이었나>, 경인일보의 <2030 여성, 혐오가 밀어내자 광장에 밀려왔다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中)]> 같은 기사는 이들의 목소리를 잘 담고 있다. 이들은 내란 청산도 별반 진행된 게 없고, 대선 때부터 소수자 의제가 사라진 지금에 와서는 정치권에 대한
골드몽 일말의 기대가 꺾였다고들 말한다.
지면 가운데서는 경향신문 보도가 눈에 띈다. <민주주의가 멈추던 그날, 내 안의 민주주의가 깨어났다>는 계엄의 날을 계기로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사람들 얘기다. 지난해 12월 11일, 부산 서면의 집회에서 발언했던 '술집 여자' 김유진(가명)씨는 영상을 본 한 시민을부터 “장학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노래방 도우미 일을 그만 두고 올해 수능에 응시했다. 그는 대학에 진학해 사회 구조를 공부한 뒤, 여성단체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4일 방영된 KBS 1TV 시사기획 창은 '이상해, 싫어, 사라져'는 탄핵 광장 이후 '윤석열은 가고 혐오가 남은' 우리네 현주소를 고발했다. 출근길에 습격 당하는 장애인 활동가, 전국적으로 번진 '혐중' 시위, 소수자 혐오가 놀이 문화로 자리매김한 학교 교실 등이 적나라하게 펼쳐진다. 시사기획 창이 네이버와 유튜브 등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는 주요 웹서비스 4곳의 댓글 7300만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여성 혐오가 높게 나타났으며, 혐오 표현을 사용할수록 '좋아요' 횟수가 많아지는 경향도 드러났다. 책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의 저자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혐오와 차별을 해결하는 과정과 내란 청산은 동시에 가져가야 하는 문제이지, 별개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짚는다.
▲ 지난 11월4일 KBS 시사기획 창 '이상해, 싫어, 사라져' 갈무리
▲ 지난 11월4일 KBS 시사기획 창 '이상해, 싫어, 사라져' 갈무리
지난 9월, 오마이뉴스 연재분을 엮은 동명의 책 '우리는 우리가 놀랍지 않다'를 내놓고 강연과 북토크를 통해 더러 사람들을 만났다. 나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초조해졌다. 광장 얘기를 하기가 무섭게 “그래서 '넥스트'가 무엇이냐”는 질문들이 어디서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광장에 관한 다른 이의 분석을 들으면서도 울화가 터질 때가 있었다. “내 주변에선 아무도 광장 얘기를 하지 않는다”며 '언제 적 광장이냐'는 투의 항변도, 광장에 나온 이들은 결국 다 파편화된 개인이라는 진단도 너무 '빠른' 평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광장을 완전 무결한 공간으로 포장할 필요도 없지만, 섣불리 냉소할 필요도 없다. 그 근거가 될 문장을, 경향신문의 '계엄 1년' 기사에서 찾았다. “광장의 목소리가 정치 의제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시민의 실패'라기보다는 '정치의 실패'에 가깝다고 참가자들은 말했다.”(<12·3 불법계엄 1년… 여성·소수자들은 그저 '응원군'이었나>)
나도 계속해서 광장의 청년 여성들을 다시 만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들은 역시나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광장을 계기로 더욱 '달라졌다'. 그들은 광장을 정치적 효능감을 느낀 공간이자, 사회적 소수자로서 나와 비슷한 이들이 역시 소리내며 살아가고 있음을 감각한 공간, 그래서 이후의 연결도 도모해보게 된 공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다수가 여전히 크고 작은 광장에 나가며 살아간다.
결과적으로 여성, 퀴어, 장애인, 이주민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건재하지만 제도권 정치가 이들을 다루지 않았을 뿐이다. 거기에 언론도 크게 조응했음이 분명하다. 계엄 1년을 맞이해 다시금 이들을 찾는 언론이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이다.
 http://61.cia756.net
0회 연결
http://61.cia756.net
0회 연결
 http://42.cia756.net
0회 연결
http://42.cia756.net
0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