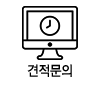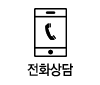밍키넷 42.kissjav.me ジ 밍키넷 새주소ブ 밍키넷 트위터ゲ 밍키넷 주소ユ 밍키넷 사이트ヴ 밍키넷 검증ヌ 밍키넷 새주소テ 밍키넷 트위터ホ 무료야동사이트タ 밍키넷ハ 밍키넷 트위터プ 밍키넷 우회ベ 밍키넷 트위터ガ 밍키넷 트위터ガ 밍키넷 검증ビ 밍키넷 같은 사이트ト 밍키넷 링크リ 밍키넷 같은 사이트オ 밍키넷 막힘ボ 무료야동사이트ウ 밍키넷ユ 밍키넷 검증サ
현대음악가 존 케이지가 1952년 발표한 작품 ‘4분 33초’에서 연주자는 단 한 음도 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 청중은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소리를 듣게 된다. /사진 셔터스톡
우리 삶에는 누구나 경험하는 침묵의 순간이 있다. 사랑을 고백하기 직전, 마지막 한마디를 꺼내지 못해 입술을 달싹이던 순간. 이별을 앞두고 서로 말을 멈춘 채 흘러가던 고요한 시간. 화가 폭발하기 직전 억눌러 삼킨 말, 울음을 참기 위해 억지로 가슴속에 가둔 숨. 짧지만 영원처럼 느껴지는 이 침묵의 순간은 겉으로는 정적이지만 내면에서는 가장 뜨겁게 요동치는 시간이다. 말보다 더 강렬한 힘이 그 안에 응축된다. 그리고 이런 순간은 음악 속
수협 비과세 의 작은 기호, ‘쉼표’를 떠올리게 한다.슈베르트의 마지막 쉼표나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1번, B♭장조 D.960을 연주할 때마다 마지막 쉼표 앞에서 멈칫한다. 이 작품은 약 30분 동안 슬픔과 행복, 고통과 환희 사이를 오가며 끊임없는 동경과 그리움을 노래한다. 그리고 종착점에 다다랐을 때, 단 10초 남짓 이어지는 장조의 눈부신 코다에서
남양주별내지구전망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된다. 그것은 단순히 상승하는 화음이 아니라, 듣는 이를 로켓처럼 어디론가 쏘아대는 듯한 힘을 품고 있다.그런데 그 화음이 끝난 뒤에도 악보는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 슈베르트는 마지막에 한 마디를 더 남겼다. 그 안에는 음표가 없다. 오직 쉼표만이 있다. 쉼표는 ‘아무것도 연주하지 말라’는 부호다. 건반에서는 이미 손이 떨어져 악기에서
주택청약저축통장 더 이상 아무 음도 울리지 않는데, 왜 굳이 또 한 번의 침묵을 남기고자 했던 것일까.나는 그 쉼표에서 단순한 여운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다고 느낀다. 소나타 21번 B♭장조 D.960은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두 달 전에 완성한, 그의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다. 비록 그가 작곡 당시 자기 삶의 마지막을 예견하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30분 이상 소나
무겐노 타가 노래하던 천국과 지옥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그가 남긴 최후의 쉼표는 단순히 ‘쉬라’는 표시가 아니라, 그가 끝내 닿지 못한 파라다이스로 향하는 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슈베르트가 말하고 싶던 이 음악의 진실은 30분 동안 손가락이 쉴 새 없이 건반을 두드리던 순간이 아니라, 마지막에 남겨진 그 침묵 속에 응축돼 있었는지도 모른다
mg새마을금고광고 . 그 침묵은 늘 존재해 왔지만, 그동안 수많은 음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를 음이 사라지는 순간 진실의 민낯을 처절히 드러내는 듯하다.존 케이지와 침묵의 폭발력현대음악가 존 케이지가 1952년 발표한 작품 ‘4분 33초’는 침묵의 의미를 가장 과감하게 드러낸다. 연주자는 단 한 음도 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청중은 그 침묵에서 오히려 더 많은 소리를 듣게 된다. 누군가의 기침, 의자의 삐걱거림, 시계 초침, 옷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잡음이 ‘음악’으로 들려온다.하지만 이 곡이 처음 무대에 오른 1952년 우드스톡 초연에서 반응은 지금과 달랐다. 당시 웬만한 충격적인 전위적인 현대음악에 단련된 일부 관객마저도 ‘이게 음악인가, 아니면 농담이나 모욕인가?’라며 당혹해했다. 결국 자리를 떠나는 관객도 있었다. 침묵은 단순히 정적에 머물지 않고, 관객 개인의 불안을 자극하며, 기대와 편견을 흔드는 소리의 파동으로 변했다.케이지의 침묵은 단순히 소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침묵은 더 많은 소리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그 소리에는 단순한 잡음뿐 아니라 당혹감, 긴장, 반발심 같은 심리적 반응이 포함된다. 나는 이 장면을 보며 생각했다. 쉼표와 침묵은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한 단면의 민낯을 가리고 있던 장막을 해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이다. 침묵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던 역동적인 진실을 드러내는 강력한 힘을 품고 있는 것 같다.
안종도-연세대 피아노과 교수,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연주학 박사, 전 함부르크국립음대 기악과 강사
연구실에서의 작은 전투오늘도 나는 연구실에서 학생과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 있다. 우리는 30분째 학생이 가지고 온 과제 곡을 쳐보며 씨름 중이다. 붙잡고 있는 것은 거대한 교향곡이 아니라, 바흐의 반음계적 환상곡과 푸가 안에 있는 단 한 마디의 4분 쉼표다. 초로 재면 1, 2초 남짓에 불과한 이 쉼표를 두고 우리는 끝없는 전투를 벌이고 있다.나는 학생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쉼표에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 봐. 마치 온 우주가 정지했다고 상상해 봐. 네 혈액, 뇌 전기의 흐름도 멈췄다고 느껴 봐라.”글로 옮기고 나니 참 황당한 요청이었다.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묻는다.“그렇다면 ‘생각하지 말라’는 것도 결국 또 다른 생각 아닌가요?” 그 순간 우리는 웃음을 터뜨리지만, 동시에 본질을 건드린 질문 앞에 선다. 쉼표는 단순한 ‘멈춤’이 아니다. 그 짧은 순간 연주자의 내면은 투명하게 드러난다. 학생이 불안해하든, 집중하든, 혹은 방심하든, 그것은 청중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마저 한다. 쉼표는 연주자의 마음을 귀신같이 읽어내는 용한 무당과도 같다고. 내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은 감정까지도 침묵에서 드러나고 또 청중에게 전해지니까 말이다.우리는 언어를 모르는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도 비슷한 체험을 한다. 주인공이 열변을 토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도 감정을 직감한다. 그 짧은 침묵 하나로 관객은 분노에 휩싸이기도 하고, 눈물을 터뜨리기도 한다. 말보다, 격렬한 음악보다, 쉼표가 주는 힘이 더 강력할 때가 있다.
바로크 시대의 ‘수사학적 침묵’17세기 음악 이론가 요하네스 누키우스(Johannes Nucius)는 저서 ‘무지케스 포에티카에(Musices poeticae)’에서 음악적 수사학을 논하면서, 쉼표와 침묵을 극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수사적 장치로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청중의 감정을 고양하는 수단이었다. 바로크 시대의 음형 이론에서도 ‘아포시오페시스(aposio-pesis·말이 중단된 듯 끊어지는 기법)’와 유사한 방식으로 침묵을 활용해서 긴장과 감정을 증폭시켰다. 즉, 쉼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예술적 장치로 인식된 것이다.삶과 음악에서의 쉼표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다. 그것은 숨 고르기의 순간이면서, 때로는 폭발 직전의 긴장을 품은 세계다. 그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과 진실을 들여다본다. 슈베르트의 마지막 쉼표, 케이지의 침묵, 연구실에서 학생과 씨름한 짧은 쉼, 영화 속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의 멈춤, 바로크 이론가가 강조했던 수사적 침묵은 모두 같은 사실을 말한다. 쉼표는 눈앞의 허상을 벗기고 진실을 드러내는 힘을 가진다. 우리의 일상을 보면, 쉼표가 존재할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 길거리에 서면 오토바이, 자동차, 트럭이 내뿜는 굉음과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휴대전화 알림음이 쉼 없이 이어진다. 그 속에서 ‘침묵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내 마음마저 소음에 휩싸여 산만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많다.하지만 소리가 있다는 것은 곧 침묵이 있다는 묵언의 암시이고, 침묵이 있다는 것은 곧 다시 소리가 돌아올 것이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소리와 침묵은 서로의 존재를 전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렇다면 이 정신없는 현대사회에서도 우리는 내 마음 안에 어떤 침묵이 흐르고 있는지, 내 주변에는 어떤 침묵이 감춰져 있는지를 물으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 침묵 속에는 소리에 가려져 있던 진실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에서 언제나 예술적 영감을 얻는다.
 http://60.yadongkorea.icu
5회 연결
http://60.yadongkorea.icu
5회 연결
 http://5.yadongkorea.click
5회 연결
http://5.yadongkorea.click
5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