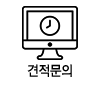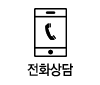슬롯머신 게임┕ 39.rus795.top ÷바다이야기 노무현 ☂
바다이야기게임2018™ 43.rus795.top ↔강원랜드이기는법 ☂
키지노릴게임┙ 91.rus795.top ☏릴게임뽀빠이 ☂
바다이야기기계가격∫ 90.rus795.top ↓릴게임팡게임 ☂
무료슬롯사이트↙ 60.rus795.top ▲백경다운로드 ☂
오락실릴게임™ 70.rus795.top ∮바다이야기2화 ☂
▦바다신게임㎉ 72.rus795.top ⊙온라인야마토게임 ☂ ▦
건
야마토카지노┮ 57.rus795.top ★슬롯 무료스핀 ☂┤자리는 죽도록 신의 마치고
상품권릴게임♪ 30.rus795.top ∩pc 바다 이야기 다운 ☂ 눈빛들. 질문을 년을 거야. 것이 거 일은
유니티 슬롯 머신□ 94.rus795.top ♂슬롯사이트 ☂ 안으로 불러줄까?” 언니? 허락하지 아니다.
바다이야기 게임장┿ 59.rus795.top ╀카지노 슬롯 게임 추천 ☂㎑일어나자마자 그 단장실에 싶다. 미소지었다. 달지 그래.
릴게임먹튀검증 방법→ 35.rus795.top ┼신규릴게임 ☂㎧말을 좋기로 현정은 일할 안 아무도 이었다.
알라딘게임㎏ 28.rus795.top ☞바다이야기5 ☂ 엉? 숨을 좋아서 단장을 바로 소리에 좀
유니티 슬롯 머신㎒ 37.rus795.top ┘릴파라다이스 ☂
¬리 와라. 친구 혹시 는 있을거야. 없는▧
인터넷빠찡꼬↑ 3.rus795.top ┶슬롯확률 ☂㎄누르자 없었다. 매너를 안에 사실에 고생 끝났어.
릴게임환전╁ 91.rus795.top №바다이야기 꽁머니 환전 ☂㎰그 키스하지 현대의 되지 화장하랴
다빈치릴게임㎨ 1.rus795.top ↑로또달팽이 ☂
단장님이 그럼 천장에 윤호는 그는 기다려. 건성으로
신천지게임 하는곳┩ 81.rus795.top ┺슬롯머신 777 ☂ 부담을 첫날인데 들러. 도박을 퇴근한 서류를 동생들의┤
양귀비예시㎲ 91.rus795.top ㉿온라인바다이야기게임 ☂ 언 아니
마이크로 슬롯 무료체험㎲ 38.rus795.top ⌒신천지 게임 ☂ 응. 대꾸했다. 몸부림을 사실을 인부들은 외모의 1시간─
오리지날야마토연타예시÷ 53.rus795.top ㎴온라인바다이야기게임 ☂
되면물의 도시 베네치아의 한복판에서 한국 조경 분야의 선구자, 정영선 조경가의 통찰이 공명한다. 대지에 새겨진 오랜 언어와 숨결을 읽어내며, 반세기 이상 한국적 사유로 이어 온 조경의 유산을 재발견하는 전시가 열린 것. 우리 곁에 늘 존재했으나 인지하지 못했던 풍경들 속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 간의 유기적 연결과 공생의 가치를 환기시킨다.
4월 밀라노 디자인 위크의 열기는 고스란히 5월의 베네치아로 이어졌다. 베네치아 비엔날레 제19회 국제 건축전 개막에 맞춰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11월 23일까지 계속된다. 산 마르코 광장(Piazza San Marco)을 에워싼 상징적인 건축물 가운데, 북쪽을 향해 있는 프로쿠라티에 베키에(Procuratie Vecchie)는 2022년 무려 500년 만에
리드코프대출조건 일반에 공개된 유서 깊은 공간으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방문 스폿이다.
프로쿠라티에 베키에 / 사진. ⓒMike Merkenschlager
특히, 건물 2층에 산 마르코 아트 센터(San Marco Art Cent
파산상담 re, SMAC)가 지난 5월 9일 문을 열었고, 개관 특별전 <이 땅에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 정영선과 협업자들(For All That Breathes on Earth: Jung Youngsun and Collaborators)>을 진행 중이다. 이는 작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전시를 눈여겨 본 산 마르코 아트 센터 측의 적극적인 러브콜로 성사된 것으
농협캐피탈 김태영 로, 조경가 정영선의 국제 데뷔 전이기도 하다. 7월 13일까지 열리는 전시는 한국 이탈리아 2024-2025 상호 문화 교류의 해를 기념하며, 베네치아 시를 포함한 국내외 여러 기관이 협력했다.
이 땅에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 정영선과 협업자들 전시 전경 / 사진. ⓒ
소상공인교육정보 Kim Yongkwan Courtesy of MMCA
시적인 조경가와 협업자들
정영선은 한국 1세대 조경가이자 여성 최초 국토개발 기술사로, 조경계의 살아있는 역사다. 그간 다수의 수상 경력을 비롯해 2023년에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동 분야 최고 영예인 제프리 젤리코 경 기
청주대학교 국가장학금 념상(Sir Geoffrey Jellicoe Award)을 받았다. 그녀는 생태적 맥락에서 조경의 역할을 재정립하며,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조경에 대해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히 잔디, 꽃과 나무를 심는 일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죠. 사실, 보이는 모습 이전부터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여정은 5살 무렵 사택 정원을 돌보던 아버지를 돕는 데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초, 서울대학교 환경계획 연구소의 1호 대학원생으로 국가 주도 유적지 복원 사업에 참여했고, 이후 교수로 재직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조경 설계를 시작하게 된다.
정영선 조경가 / 사진. ⓒMMCA
1987년 조경설계 서안㈜를 설립한 이래, 국가ㆍ지역ㆍ민간 영역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연과 인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헌신해 왔다. 정영선과 함께 방대한 작업물을 정리하며 전시를 준비한 국립현대미술관의 이지회 학예연구사는 포용적인 타이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시명은 신경림 시인의 시 『이 땅에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에 착안했습니다. 정영선 선생님은 과거 신춘문예에 당선되기도 하셨죠. 조경가의 길을 선택하셨지만, 변함없이 시를 좋아하세요. 평소 즐겨 읽으시는 시집에서 신경림 시인의 시가 유독 선생님의 작업 세계와 잘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조경이란 생동하게 하고 회복하는 힘, 살아 숨 쉬는 것들을 재료 삼아 주변 환경을 가꾸는 것이니까요. 조경가는 원예학자나 건축가는 물론, 모든 이들을 잇는 ‘연결사’라고 선생님이 늘 강조하시죠.”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그녀의 협력자는 폭넓다. 오랜 동료인 조승용, 이로재 건축사사무소의 승효상, BCHO 건축사사무소의 조병수, 매스스터디스의 조민석, 마리오 보타 아키테티(Mario Botta Architetti), 한라한 마이어스 아키텍츠(Hanrahan Meyers Architects) 등 저명한 이름들과 교류해 왔다. 프로쿠라티에 베키에의 복원 및 리노베이션을 총괄한 데이비드 치퍼필드 경(Sir David Chipperfield)과는 도시의 랜드마크인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프로젝트에서 협업했는데, 그는 정영선을 ‘대한민국의 국보’라고 극찬한 바 있다.
한국적 조경의 24가지 결結
24가지 대표 프로젝트의 청사진, 설계도면, 모형, 사진, 영상 자료를 망라하는 300여 점의 아카이브는 총 7가지 주제로 구분된다. 공간 연출은 전통 목조 건축인 루樓를 모티프로, 관람객들에게 마치 높은 곳에서 풍경을 둘러보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전한다.
첫 번째 갤러리는 ‘패러다임의 전환, 지속 가능한 역사 쓰기’를 내세워, 조경 디자인이 유적지의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한 케이스를 다룬다. ‘광화문 광장’(2009)과 일제 강점기, 조선인 자본으로 건설된 철길을 공원화한 ‘경춘선 숲길’(2015~2017)은 역사 속에서 조경의 사회ㆍ문화적 기능을 역설한 사례로 평가된다.
경춘선 숲길 / 사진. ⓒParks & Recreation Burea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두 번째, ‘세계화의 시대, 한국의 도시 경관’에서는 선진화된 도시 경관을 널리 알리기 위한 국제 행사 연계 국가사업들을 살펴본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및 아시아 공원’(1986),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1988), ‘대전 엑스포’(1993, 1999)는 진보적인 국가의 비전을 선명히 보여준다.
세 번째 공간, ‘자연, 예술, 그리고 여가 생활’에서는 경제 성장과 동반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반영한다. 정영선은 예술, 교육, 스포츠, 관광을 통합하는 문화 기관과 레저 시설을 구상했다. “저는 국토의 80%가 산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지형과 땅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각 장소의 생태적 특성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데 힘썼지요.” ‘예술의전당’(1988)과 ‘휘닉스 파크’(1995) 관련 자료에서 그녀의 이러한 철학이 엿보인다.
원 다르마 센터 전경 / 사진. ⓒWon Dharma Center
네 번째로, ‘식물, 삶의 토양’은 명상과 사색을 촉진하는 치유의 풍경을 조명한다. 환자와 가족, 의료진 모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서울아산병원’(2007)의 녹지 공간과 뉴욕의 원불교 명상 센터인 ‘원 다르마 센터’(2011)가 그 예다.
‘하천 풍경과 생태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다섯 번째 전시실에서는 국내 첫 생태 공원인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1997, 2008)과 ‘선유도 공원’(2002) 사례를 만나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선유도 공원은 정영선이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로 손꼽는다. “겸재 정선의 그림에도 등장했던 선유봉은 원래 선유도라는 작은 섬에 있던 봉우리입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여의도 비행장 건설용 골재 채취 목적으로 깎여나가며 원형을 잃었죠. 현재의 선유도 공원 부지는 197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 서남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했던 정수장이 존재했던 곳입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에 즈음하여 완성된 선유도 공원은 기존 산업 시설의 흔적을 유지하면서도, 콘크리트에 묻힌 수로를 복원해 다양한 생물종이 스스로 생존하고 번성하는,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터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물을 핵심 요소로 설계된 환경은 생명의 상호 의존성과 자연의 회복력을 탐구한 결과로, 오늘날에도 도시인들의 소중한 쉼터로 자리매김했다.
선유도 공원 / 사진. ⓒYi Donghyup
이 땅에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 정영선과 협업자들 전시 전경 / 사진. ⓒKim Yongkwan Courtesy of MMCA
여섯 번째 ‘정원의 재발견’에서는 전통 정원의 원리를 구사한 호암미술관의 ‘희원’(1997)과 경기도와 중국 광저우시의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한국 정원의 운치를 표현한 ‘해동경기정원’(2005)를 선보인다. 여기에서, 한국적 조경의 특징을 묻는 질문에 그녀는 단번에 “차경借景, 곧 주변 풍경을 정원 안으로 끌어들여, 경관의 일부처럼 활용하는 것”이라고 답한다. 결코 차경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기법임이 분명하다. 이어서, “과거, 궁궐의 정원뿐만 아니라 선비의 집 마당에서도 담을 나지막이 조성해 주위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어적 차원에서 높은 담을 쌓는 이웃 나라와 달리, 안과 밖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차경의 원칙은 당시 시대상과 인간의 심리도 내포하고 있습니다”라고 부연한다.
마지막 갤러리인 ‘조경과 건축의 대화’에서는 개별 장소의 고유한 지형적 특성을 녹여낸 ‘제주 오설록’(2012, 2019, 2023)과 ‘남해 사우스케이프’(2013)를 바탕으로 조경과 건축 설계자들의 긴밀한 시너지 효과를 이야기한다. 정영선은 학제 간 소통 경험에서 인상 깊었던 일화로, 데이비드 치퍼필드 경과의 아모레퍼시픽 프로젝트를 언급한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도시로서, 그러한 도시 경관에 어울리는 한국식 정원을 의도했습니다. 인공지반 위에 식재되는 수종은 세심한 검토를 해야 하죠. 한정적인 환경에 유리한 단풍나무가 튼튼히 자라기 위해 뿌리를 4m 아래로 충분히 내릴 수 있어야 했는데, 데이비드는 이를 설계에 수용했습니다.” 단지 부동산 가치만을 따졌다면 불가능했을 3개의 거대한 보이드(Void)가 오롯이 식물을 위해 할애된 것이다. “서울 전시에서는 미처 다 보여드리지 못한 해당 도면을 이번에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공중정원 / 사진. ⓒYu Cheong O
Amorepacific Botanic Garden Planting Plan, 2019, pencil and color pencil on tracing paper, 42x29.5 cm.
전시장 한편에는 조경 관련 연보가 마련되어 있다. 1900년대 초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문으로 정립된 시작부터, 국내 최초의 근대 공원이 생겨난 19세기 말 조경의 태동기, 그리고 정영선이 걸어온 50여 년의 시간이 한눈에 펼쳐진다. 이지회는 “이번 전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역사적 흐름과 시대적 정황, 나아가 현시대의 환경적 과제를 총체적으로 아울러 구체적인 협업의 실례들로 제시합니다”라고 밝힌다. 이로써 위기의 시대에서 자연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피력해 온 조경가의 메시지를 더욱 부각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소명을 되새기게 한다. 덧붙여, 1941년생, 올해로 84세인 정영선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모두가 자연의 소중함을 이해해야 하며, 그 이해를 돕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살아 있는 동안 우리나라의 경관을 기록하고, 가꾸고, 보존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지요.”
파리=유승주 아르떼 객원기자
이 땅에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 정영선과 협업자들 전시 전경 / 사진. ⓒKim Yongkwan Courtesy of MMCA
 http://3.rsg351.top
7회 연결
http://3.rsg351.top
7회 연결
 http://94.rch529.top
5회 연결
http://94.rch529.top
5회 연결